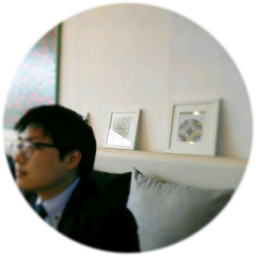요한복음: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이 밖에도 상세한 '사복음서간 비교'는 톰슨II성경주석의 도표연구, 19p를 참고할 것) | (이 밖에도 상세한 '사복음서간 비교'는 톰슨II성경주석의 도표연구, 19p를 참고할 것) | ||
== 요한복음의 서문(Johannine Prologue) == | == 요한복음의 서문(Johannine Prologue) (요1:1-18) == | ||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종종 "서론" 또는 "서문"으로 간주된다. |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종종 "서론" 또는 "서문"으로 간주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서문이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이 작성된 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주제와 신학적 관점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이에 대한 명백한 문헌적 증거는 없으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2] | ||
== 간음한 여자와 예수 (요7:53-8:11) == | |||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자와 예수의 이야기(요한복음 7:53–8:11)는 고대의 일부 성경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치가 다르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wikipedia:John_8|Pericope adulterae]]] 따라서 이 본문이 나오지 않는 오래된 성경 역본이나 사본은 다음과 같다; | |||
{| class="wikitable" | |||
|+ | |||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요 고대 사본들 | |||
!이 본문이 빠져 있는 주요 고대 역본들 (번역본) | |||
|- | |||
|시내 사본 (Codex Sinaiticus, 4세기) | |||
바티칸 사본 (Codex Vaticanus, 4세기) | |||
알렉산드리아 사본 (Codex Alexandrinus, 일부만 있음) | |||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 예: | |||
[[wikipedia:Papyrus_66|P66]] (ca. AD 200) | |||
[[wikipedia:Papyrus_75|P75]] (ca. AD 175–225) | |||
|고대 시리아어 역본 (시리아어 페쉬타, Peshitta) | |||
고대 라틴어 일부 사본 (Old Latin manuscripts) – 일부만 포함, 대부분 미포함. | |||
사보이아 성경 ([[wikipedia:Codex_Bobiensis|Codex Bobiensis]], 고대 라틴어 사본) – 미포함. | |||
[[wikipedia:Gothic_Bible|고트어(고딕) 성경]] – 미포함. | |||
|} | |||
요한복음 7:53–8:11은 초기 사본들에는 없고, 후대 사본들에서 추가된 본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현대 성경(예: NIV, ESV, NASB 등)은 이 구절에 각주나 괄호를 붙여 "초기 사본에는 없다"고 명시한다. (UBS5/NA28 그리스어 본문에는 본문 하단에 분리 표기하고 “후대 삽입”으로 분류하였다.)[3]<blockquote>The earliest manuscripts and many other ancient witnesses do not have John 7:53-8:11 (NIV) | |||
This passage, though widely known and of high ethical and spiritual value, is almost certainly not part of the original text of John. It is lacking in the earliest and best Greek manuscripts, and its style and vocabulary differ from the rest of the Gospel. (UBS5, Introduction to the Reader, p. 363 [Critical Apparatus notes]) | |||
The pericope of the adulteress (7,53–8,11) is obviously not part of the original text of the Gospel of John. It is absent from the most ancient Greek manuscripts, in the best representatives of the Alexandrian, Western, and Caesarean types of text. In some manuscripts it appears after Luke 21:38, others place it after John 7:36, 7:44, or 21:25. (NA28 Apparatus / Critical Apparatus Statement on John 7:53–8:11])</blockquote>4세기, 일부 사본에 삽입되기 시작되어 [4] 5세기~중세에는 점차 정경으로 수용되었다. (Codex Bezae(D사본) – 이 본문을 포함. 그러나 스타일이 요한복음과는 약간 다름, Codex Alexandrinus, Codex Ephraemi Rescriptus 등은 유사하지만 삽입된 위치가 다르거나, 아직 포함되지 않음.) 제롬의 불가타는 번역시 이 본문을 포함하였고, 이후 중세 성경들에 폭넓게 수용되었다. 문체상 요한복음과 다르며, 누가복음에 더 가까운 어휘와 구문을 사용해 일부 학자는 원래는 누가복음 소스Lukan tradition(누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주제적 유사성-죄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강조, 누가복음 21장과 24장 사이에 삽입된 사본들이 있음. D, f13, Minuscule 1333 등)였을 것으로 본다. | |||
'''이 구절이 후대 삽입된 본문이라면, 왜 여전히 많은 교회 전통과 성경 번역본이 정경(canon)에 포함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 |||
1) 교회 전통 속에서의 오랜 사용과 수용; 4세기 이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본문은 정기적으로 읽히고 설교되었으며, 교훈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Augustine)과 암브로시우스(Ambrose) 같은 교부들은 이 본문을 진정한 복음의 일부로 간주했다. 어거스틴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본문을 제거한 이유가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장면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 <u>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 읽고 설교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사실 자체가 정경성을 입증한다</u>(정경적 실천(canonical practice)이라는 개념). | |||
2) 예수의 성품과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예수의 자비, 용서, 지혜,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중심 주제는 신약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복음의 정신을 강하게 보여주며, 그 내용이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 <u>정경성은 단순한 역사적 원본성만이 아니라, 교리적 조화성과 신앙 공동체의 수용도를 포함한다.</u> | |||
3) 후대 삽입이 반드시 정경성 결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본래 동적(dynamic)이며, 수세기에 걸쳐 전통과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다. <u>따라서 본문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정경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u>. | |||
공의회 차원이나 신조 차원에서 해당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논란이 된 공식 사례는 없으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이 구절이 일부 고대 사본에서 결여되어 있음을 최초로 직접 언급하였다(1516년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인 『Novum Instrumentum omne』의 주석). 이후 본문 비평학의 발전(19세기 이후)에 따라 해당 구절의 본문적 진위 여부가 학문적으로 제기되었다. 브루스 M. 메츠거(Bruce M. Metzger), 바트 D. 에어만(Bart D. Ehrman) 등은 이 본문이 초기에 없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교회 전통에서의 유용성과 신학적 가치는 인정한다. [6] | |||
이밖에, 마가복음 16:9-20([[공관복음#마가복음의 갑작스러운 결말(The Ending of Mark)|마가복음의 긴 결말]], Long Ending of Mark), 요한일서 5장 7-8절의 삼위일체 암시, 사도행전 8장 37절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 마태복음 6장 13절 하의 주기도문 마지막 등이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 |||
== 빌립을 통해 예수를 뵙기 청하는 그리스인들 (요12:20-22) == | |||
[[헬라어#복음서 안에서 헬라어(또는 라틴어) 사용|'복음서 안에서 헬라어(또는 라틴어) 사용]]을 참고할 것. | |||
== 각주 == | == 각주 == | ||
| 26번째 줄: | 71번째 줄: | ||
* 전통적 배경: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신앙 고백과 교훈을 반영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 * 전통적 배경: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신앙 고백과 교훈을 반영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 ||
[2] 초대 사본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한복음의 서문(1:1-18)이 없는 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문이 후대 삽입이라는 주장은 문헌 증거보다는 신학적・문학적 분석에 근거한 견해이다. | [2] 초대 사본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한복음의 서문(1:1-18)이 없는 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문이 후대 삽입이라는 주장은 문헌 증거보다는 신학적・문학적 분석에 근거한 견해이다; | ||
이 서문의 가설은, 1) 시적・찬송가적 구조를 가지며, 1:19부터는 산문 형태로 전개된다(전통적인 헬라-유대 찬송 구조로 여겨짐). 2) 말씀에 대한 고도의 신학 개념이 이후 본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압축적이다. 3)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찬송가(hymn) 혹은 기독론적 선언문을 요한이 편집해 넣은 것으로 본다. | |||
오히려 이 서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과 구조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서사 장치로, 처음부터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수적・주류 학계에서는 이를 요한 저자의 의도된 서문으로 본다. | |||
[3] NA28/UBS5의 주요 주석 요약(의역); “이 본문은 가장 초기의 주요 사본들(예: P66, P75, א, B, N 등)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대 교부들의 주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의 다수 사본에서 이 구절이 삽입되어 전승되며, 삽입 위치 역시 다양하다(요 7:36, 7:52, 21:25 후, 또는 누가복음 21장 부근). 따라서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구전되던 독립 전승으로 보이며,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
[4] 오리겐(Origen, 3세기): 이 본문에 대한 주석 없음, 요한 크리소스톰(4세기 후반): 이 본문을 건너뛰고 주석, 터툴리안(Tertullian, 2세기 후반-3세기 초)의 저작에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 직접 인용되거나 간접 언급되나(특히 윤리적・도덕적 주제를 다룰 때, 그는 자주 복음서 본문을 인용) 그중에서도 간음(adultery)과 관련된 문헌에서도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지 않았음(De Pudicitia (순결에 대하여); 간음과 참회에 관한 교리 논쟁, De Monogamia (일부일처제에 대하여); 재혼, 성적 순결 문제, Ad Uxorem (아내에게); 기독교적 결혼 윤리). 터툴리안의 침묵은 이 본문이 3세기 초 북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경으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
[5] Quidam modicae fidei, vel potius inimici verae fidei, timentes peccandi impunitatem dari mulieribus suis, illud removerunt de codicibus suis, quasi permissionem peccandi tribuentem. – Tract. 33 in Joannem, §5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거나 참된 믿음의 적대자들로서, 자기 아내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오해할까 두려워하여, 그 이야기를 성경 사본에서 지워버렸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본문이 죄를 허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 (In Iohannis Evangelium Tractatus), 원문 제목: Tractatus CXXIV in Evangelium Ioannis, 해당 설교: Tractatus 33 (요한복음 8:1–11 주석), 작성 시기: 약 A.D. 416년경 | |||
<u>그가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의 일부이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확신한 근거</u>는, 1) “Evangelium veritas est; illi falsarii sunt. 복음은 진리이고, (본문을 삭제한)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강해 33강 (Tractatus 33) 2)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는 정죄하시되, 죄인을 용서하신다.” 이 본문이 예수의 자비,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3) “사람들이 방종을 두려워해 제거했다면, 오히려 그 본문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뜻 아닌가?” 이 논리는 삭제 시도 자체가 본문이 정통 전통 안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 |||
[6] 에라스무스는 본문에 해당 구절을 포함시키면서도, 주석(라틴어, 초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
'''“In Graecis codicibus nonnullis fidissimis haec pericope de adultera non reperitur.”''' – ''Novum Instrumentum omne'', 1516, Annotationes in Evangelium Ioannis, ad locum | |||
“In the most accurate Greek manuscripts, this story is missing. (가장 정확한(신뢰할 만한)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 발견되지 않는다.)” | |||
이는 그가 당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본들 중 일부에서 이 본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
Metzger, B. M. (1994).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 |||
Ehrman, B. D. (2005).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HarperSanFrancisco. | |||
Kruger, M. J. (2012). Canon Revisited: Establishing the Origins and Authority of the New Testament Books. Crossway. | |||
[7]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암시: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 라틴어 불가타 역에만 있음.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엔 없음 | |||
사도행전 8:37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기 전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 후기 사본에서만 등장 | |||
마태복음 6:13하 주기도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 가장 오래된 사본(예: 시내 사본)들에는 없음 | |||
2025년 5월 21일 (수) 11:30 기준 최신판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복음서 사이 관계 문제를 살펴보려면 공관복음의 공관복음서 문제를 참고할 것)
(한국컴퓨터선교회(KCM)에서 4복음서 평행대조(parallels)를 볼 수 있다. 영문 사이트는 Michael Marlowe의 Bible-Researcher.com을 참고할 수 있다.)
집필 시기와 저자, 기록된 언어
요한복음은 서기 90~110년경에 최종 형태를 갖추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서기 66년에서 98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교부 이레네우스Irenaeus의 증언). 이 밖에도 사도요한은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모두 코이네 그리스어로 집필했다.
(복음서를 포함하여 신약성경의 집필연대와 순서를 살펴보려면, 구글에서 the order of record of the New Testament, the chronology of the New Testament 그리고 Timeline of the New Testament를 검색할 것.)
요한복음의 특징과 예수에 대한 관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공관복음(마태-마가-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요한이 복음서를 썼기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때문에 요한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다.
넬슨성경개관, 350p, 조이선교회 역/출간
(이 밖에도 상세한 '사복음서간 비교'는 톰슨II성경주석의 도표연구, 19p를 참고할 것)
요한복음의 서문(Johannine Prologue) (요1:1-18)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종종 "서론" 또는 "서문"으로 간주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서문이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이 작성된 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의 주제와 신학적 관점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이에 대한 명백한 문헌적 증거는 없으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2]
간음한 여자와 예수 (요7:53-8:11)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자와 예수의 이야기(요한복음 7:53–8:11)는 고대의 일부 성경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치가 다르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Pericope adulterae] 따라서 이 본문이 나오지 않는 오래된 성경 역본이나 사본은 다음과 같다;
|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요 고대 사본들 | 이 본문이 빠져 있는 주요 고대 역본들 (번역본) |
|---|---|
| 시내 사본 (Codex Sinaiticus, 4세기)
바티칸 사본 (Codex Vaticanus, 4세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Codex Alexandrinus, 일부만 있음)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 예: P66 (ca. AD 200) P75 (ca. AD 175–225) |
고대 시리아어 역본 (시리아어 페쉬타, Peshitta)
고대 라틴어 일부 사본 (Old Latin manuscripts) – 일부만 포함, 대부분 미포함. 사보이아 성경 (Codex Bobiensis, 고대 라틴어 사본) – 미포함. 고트어(고딕) 성경 – 미포함. |
요한복음 7:53–8:11은 초기 사본들에는 없고, 후대 사본들에서 추가된 본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현대 성경(예: NIV, ESV, NASB 등)은 이 구절에 각주나 괄호를 붙여 "초기 사본에는 없다"고 명시한다. (UBS5/NA28 그리스어 본문에는 본문 하단에 분리 표기하고 “후대 삽입”으로 분류하였다.)[3]
The earliest manuscripts and many other ancient witnesses do not have John 7:53-8:11 (NIV)
This passage, though widely known and of high ethical and spiritual value, is almost certainly not part of the original text of John. It is lacking in the earliest and best Greek manuscripts, and its style and vocabulary differ from the rest of the Gospel. (UBS5, Introduction to the Reader, p. 363 [Critical Apparatus notes])
The pericope of the adulteress (7,53–8,11) is obviously not part of the original text of the Gospel of John. It is absent from the most ancient Greek manuscripts, in the best representatives of the Alexandrian, Western, and Caesarean types of text. In some manuscripts it appears after Luke 21:38, others place it after John 7:36, 7:44, or 21:25. (NA28 Apparatus / Critical Apparatus Statement on John 7:53–8:11])
4세기, 일부 사본에 삽입되기 시작되어 [4] 5세기~중세에는 점차 정경으로 수용되었다. (Codex Bezae(D사본) – 이 본문을 포함. 그러나 스타일이 요한복음과는 약간 다름, Codex Alexandrinus, Codex Ephraemi Rescriptus 등은 유사하지만 삽입된 위치가 다르거나, 아직 포함되지 않음.) 제롬의 불가타는 번역시 이 본문을 포함하였고, 이후 중세 성경들에 폭넓게 수용되었다. 문체상 요한복음과 다르며, 누가복음에 더 가까운 어휘와 구문을 사용해 일부 학자는 원래는 누가복음 소스Lukan tradition(누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주제적 유사성-죄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강조, 누가복음 21장과 24장 사이에 삽입된 사본들이 있음. D, f13, Minuscule 1333 등)였을 것으로 본다.
이 구절이 후대 삽입된 본문이라면, 왜 여전히 많은 교회 전통과 성경 번역본이 정경(canon)에 포함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전통 속에서의 오랜 사용과 수용; 4세기 이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본문은 정기적으로 읽히고 설교되었으며, 교훈적 권위를 부여받았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Augustine)과 암브로시우스(Ambrose) 같은 교부들은 이 본문을 진정한 복음의 일부로 간주했다. 어거스틴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본문을 제거한 이유가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장면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 읽고 설교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사실 자체가 정경성을 입증한다(정경적 실천(canonical practice)이라는 개념).
2) 예수의 성품과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예수의 자비, 용서, 지혜,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중심 주제는 신약 전체의 메시지와 일치한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복음의 정신을 강하게 보여주며, 그 내용이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룬다. 정경성은 단순한 역사적 원본성만이 아니라, 교리적 조화성과 신앙 공동체의 수용도를 포함한다.
3) 후대 삽입이 반드시 정경성 결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본래 동적(dynamic)이며, 수세기에 걸쳐 전통과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문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정경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의회 차원이나 신조 차원에서 해당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논란이 된 공식 사례는 없으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이 구절이 일부 고대 사본에서 결여되어 있음을 최초로 직접 언급하였다(1516년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인 『Novum Instrumentum omne』의 주석). 이후 본문 비평학의 발전(19세기 이후)에 따라 해당 구절의 본문적 진위 여부가 학문적으로 제기되었다. 브루스 M. 메츠거(Bruce M. Metzger), 바트 D. 에어만(Bart D. Ehrman) 등은 이 본문이 초기에 없었음을 주장하면서도, 교회 전통에서의 유용성과 신학적 가치는 인정한다. [6]
이밖에, 마가복음 16:9-20(마가복음의 긴 결말, Long Ending of Mark), 요한일서 5장 7-8절의 삼위일체 암시, 사도행전 8장 37절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 마태복음 6장 13절 하의 주기도문 마지막 등이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빌립을 통해 예수를 뵙기 청하는 그리스인들 (요12:20-22)
'복음서 안에서 헬라어(또는 라틴어) 사용을 참고할 것.
각주
[1] 요한복음의 서문이 덧붙여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신학적 정리: 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임을 명확히 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 독자 안내: 서문은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와 메시지를 미리 제시하여 독자들이 본문을 읽기 전에 중요한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문맥 설정: 서문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요한의 신학적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 전통적 배경: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신앙 고백과 교훈을 반영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2] 초대 사본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한복음의 서문(1:1-18)이 없는 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문이 후대 삽입이라는 주장은 문헌 증거보다는 신학적・문학적 분석에 근거한 견해이다;
이 서문의 가설은, 1) 시적・찬송가적 구조를 가지며, 1:19부터는 산문 형태로 전개된다(전통적인 헬라-유대 찬송 구조로 여겨짐). 2) 말씀에 대한 고도의 신학 개념이 이후 본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압축적이다. 3)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찬송가(hymn) 혹은 기독론적 선언문을 요한이 편집해 넣은 것으로 본다.
오히려 이 서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과 구조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서사 장치로, 처음부터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수적・주류 학계에서는 이를 요한 저자의 의도된 서문으로 본다.
[3] NA28/UBS5의 주요 주석 요약(의역); “이 본문은 가장 초기의 주요 사본들(예: P66, P75, א, B, N 등)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대 교부들의 주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의 다수 사본에서 이 구절이 삽입되어 전승되며, 삽입 위치 역시 다양하다(요 7:36, 7:52, 21:25 후, 또는 누가복음 21장 부근). 따라서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구전되던 독립 전승으로 보이며,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오리겐(Origen, 3세기): 이 본문에 대한 주석 없음, 요한 크리소스톰(4세기 후반): 이 본문을 건너뛰고 주석, 터툴리안(Tertullian, 2세기 후반-3세기 초)의 저작에는 신약 성경 대부분이 직접 인용되거나 간접 언급되나(특히 윤리적・도덕적 주제를 다룰 때, 그는 자주 복음서 본문을 인용) 그중에서도 간음(adultery)과 관련된 문헌에서도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지 않았음(De Pudicitia (순결에 대하여); 간음과 참회에 관한 교리 논쟁, De Monogamia (일부일처제에 대하여); 재혼, 성적 순결 문제, Ad Uxorem (아내에게); 기독교적 결혼 윤리). 터툴리안의 침묵은 이 본문이 3세기 초 북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경으로 수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5] Quidam modicae fidei, vel potius inimici verae fidei, timentes peccandi impunitatem dari mulieribus suis, illud removerunt de codicibus suis, quasi permissionem peccandi tribuentem. – Tract. 33 in Joannem, §5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거나 참된 믿음의 적대자들로서, 자기 아내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오해할까 두려워하여, 그 이야기를 성경 사본에서 지워버렸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본문이 죄를 허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 (In Iohannis Evangelium Tractatus), 원문 제목: Tractatus CXXIV in Evangelium Ioannis, 해당 설교: Tractatus 33 (요한복음 8:1–11 주석), 작성 시기: 약 A.D. 416년경
그가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의 일부이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확신한 근거는, 1) “Evangelium veritas est; illi falsarii sunt. 복음은 진리이고, (본문을 삭제한)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강해 33강 (Tractatus 33) 2)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는 정죄하시되, 죄인을 용서하신다.” 이 본문이 예수의 자비,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3) “사람들이 방종을 두려워해 제거했다면, 오히려 그 본문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뜻 아닌가?” 이 논리는 삭제 시도 자체가 본문이 정통 전통 안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6] 에라스무스는 본문에 해당 구절을 포함시키면서도, 주석(라틴어, 초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In Graecis codicibus nonnullis fidissimis haec pericope de adultera non reperitur.” – Novum Instrumentum omne, 1516, Annotationes in Evangelium Ioannis, ad locum
“In the most accurate Greek manuscripts, this story is missing. (가장 정확한(신뢰할 만한)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당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본들 중 일부에서 이 본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Metzger, B. M. (1994).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Ehrman, B. D. (2005). Misquoting Jesus: The Story Behind Who Changed the Bible and Why. HarperSanFrancisco.
Kruger, M. J. (2012). Canon Revisited: Establishing the Origins and Authority of the New Testament Books. Crossway.
[7]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암시: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 라틴어 불가타 역에만 있음.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엔 없음
사도행전 8:37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기 전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 후기 사본에서만 등장
마태복음 6:13하 주기도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 가장 오래된 사본(예: 시내 사본)들에는 없음